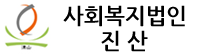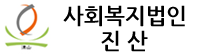ㆍ작성일 : 25-10-17 12:56
| 기고·김용권〉세종의 언어철학-한(恨)을 정(情)으로 바꾸다 | |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122 |
| | |
|
“말이 막히면 마음도 막힌다.” 세종 이도는 이 단순한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다. 그는 백성의 말이 막힌 세상을 보며, 마음이 얼어붙은 시대를 바꾸고자 했다. ‘이도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 가까운 부분(p.371~383)은 바로 그 세종의 내면적 언어철학을 보여준다. 권력자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목소리로서의 언어를 되살리고자 했던 세종의 깊은 사유가 담겨 있다. 믿음을 정으로 바꾼 사람 세종은 아내 소헌왕후를 두고 “믿음을 정으로 바꿔온 사람”이라 표현한다.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그에게 정(情)은 가장 인간적인 배움의 언어였다. 부부의 신뢰 속에서 그는 ‘믿음이 정으로 숙성되는 힘’을 깨달았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행위였고, 그 행위는 세종의 통치철학으로 이어졌다. 권력의 냉기 속에서도 세종은 끝내 인간의 따뜻함을 놓지 않았다. 왕으로서 명령하기보다 사람으로서 이해하려 했다. 그의 통치는 합리보다 온기를 우선했다. 정은 그에게 정치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었다. 한을 풀고 정을 쌓은 훈민정음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염두에 둔 것은 백성의 ‘한’이었다. 글을 몰라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말로 풀지 못하던 백성들, 그들의 침묵이 바로 세종의 고통이었다. 세종은 그 한을 풀어낼 길을 찾았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훈민정음’이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의 마음을 이어주는 ‘정의 언어’였다. 세종은 말과 글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전해질 때, 한이 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말할 수 없던 고통이 글로 드러나고, 그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때, 슬픔은 소통으로 녹아든다. 세종은 언어를 통해 인간을 회복하려 했다.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어린 백성이 쉽게 익혀 자신의 뜻을 펴게 하려 함”이라 밝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만든 문자는 지배의 언어가 아니라, 구원의 언어였다. 정 없는 지식, 따뜻한 언어의 부재 세종은 학문적 식견이 높은 신하들 사이에서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그들의 말은 논리로 가득했지만, 정이 없었다. ‘이도 다이어리’는 이를 “많이 배운 신하들의 정 없는 소통”이라 표현한다. 지식과 권위는 넘쳤지만, 인간의 온기와 이해는 사라져 있었다. 세종은 언어의 본질을 ‘정 있는 소통’에서 찾았다. 말은 옳고 그름을 겨루는 무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였다. 그래서 그는 문자를 만들면서도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했다. 훈민정음은 인간의 따뜻한 언어를 되살리려는 시도였다. 서민의 한 맺힌 삶과 정 둘 곳 없는 왕 백성들의 삶은 눈물로 이어졌다. 굶주림과 부역, 질병과 억울함 속에서 그들은 한숨으로 하루를 버텼다. 그들의 삶은 ‘한’의 역사였다. 세종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언어로 피어나길 원했다. 백성에게는 말이 곧 생존이었다. 한글은 그 생존의 언어, 생명의 언어였다. ‘서민들의 한 맺힌 살림살이’를 들여다본 세종은, 글을 통해 한을 푸는 길을 열었다. 말할 수 없는 백성이 말을 갖게 될 때, 그들은 단순한 피지배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세종 자신은 “정 둘 곳 없는 날들”을 견뎌야 했다. 왕의 자리는 높았지만, 그 마음은 쓸쓸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그는 외로웠고, 병으로 고통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외로움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 외로움을 ‘정으로 돌려주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자신을 비판하는 신하에게도, 말을 잃은 백성에게도, 그는 따뜻한 언어로 답했다. 세종의 언어, 지금 우리에게 ‘이도 다이어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세종의 언어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온기였다. 그는 한글을 통해 한(恨)을 정(情)으로 바꾸었고, 침묵의 시대를 소통의 시대로 이끌었다. 오늘날 우리는 세종이 만든 글자를 쓰지만, 그의 마음까지 함께 쓰고 있는가. 현대의 언어는 지식과 정보로 넘쳐나지만, 그 속에 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SNS의 짧은 문장과 논리의 전쟁 속에서, 세종이 말한 ‘정 있는 소통’은 점점 잊혀져 간다. 세종의 언어철학은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 물음을 던진다. “당신의 말은 따뜻한가?” 말은 지식을 쌓는 도구이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온기여야 한다. 훈민정음은 단지 글자의 발명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이해의 문법이며, 마음을 나누는 기술이었다. 한글 한 자 한 자에는 세종의 눈물이 스며 있다. 그것은 백성의 눈물이었고, 시대의 한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그 한을 정으로 바꾸었다. 언어를 통해, 그리고 사랑으로. “글은 마음의 그릇이다. 그릇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진다.” 세종의 언어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숨 쉬고 있다. 그는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다. 언어로, 그리고 정(情)으로 세상을 품었다. |
|